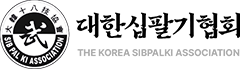사도세자와 정조
십팔기를 만든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무예를 좋아하여 대궐의 북원(北苑, 지금의 비원)에서 기예를 익혔다.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했던 세자가 특히 좋아했던 병장기는 청룡도(靑龍刀)였다.
이 청룡도는 칼 중에 가장 크고 무거워 병장기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무기로, 고조부인 효종이 다루던 것이었다.
사도세자는 용모와 성향 등 모든 점에서 효종을 빼닮았으며 매우 영특하였다.
이 때문에 일찍이 소년천자(少年天子)라는 칭찬을 아버지 영조에게서 들을 정도였다.
사도세자는 무예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세자가 보모와 함께 생활한 곳은 저승전(儲承殿)이었는데, 저승전의 후문 바깥에 군수 물자를 보관하던 군물고(軍物庫)가 있었다.
저승전에서 세자를 모신 상궁은 최 상궁과 한 상궁 두 명이었는데, 최 상궁은 세자에게 학문을, 한 상궁은 무예를 가르쳤다.
손재주가 좋았던 한상궁은 나무칼과 활등을 만들어 세자가 어린나인들과 무예놀이를 하면서 자라도록 가르쳤다.
이런 연유로 세자는 장대한 기골을 갖추고 남달리 힘도 좋았으며 병장기 등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세자는 나이 15세 무렵에는 장정들도 다루기 어렵다는 청룡도나 쇠몽둥이를 맘껏 휘둘렀으며, 특히 활쏘기와 말 타기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또한 유가(儒家)의 책보다는 병가(兵家)의 책을 더 즐겨 읽었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무(武)는 『현륭원행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범이 깊은 산에서 울부짖으니 큰 바람이 부는구나."
세자가 열네 살 때 지은 시다.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 엿보인다.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무(武)를 업신여겼으나, 세자는 달랐다. 문과 무를 겸전한 것이다.
노론과 소론, 충신과 역적을 가르는 데 혈안이 된 당파 싸움에 질려 버린 세자는 효종의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새로운 북벌을 꿈꾼다.
세자의 무예 연마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군사를 쓸 땅이 없다. 하지만 동쪽으로는 왜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접했으며, 서쪽과 남쪽 바다를 건너면 곧 중원이다."
부국강병을 꿈꾸던 사도세자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조선의 무예가 바로 십팔기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군대에서 연마해 오던 각종 기예를 재정비하여 이를 하나의 종합 무예로 만든 것이다.
천하 명궁 정조

무예를 사랑했던 사도세자의 피를 이어받은 정조 또한 문(文)과 무(武)를 겸전한 군주였다.
정조는 중국의 진시황과 한 문제를 문과 무를 양립하지 못한 사례로 들면서, 학문에 충실하였지만 무를 등한시하여
흉노의 침입을 받은 한 문제를 문치주의를 부정한 진시황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정조의 신기에 가까운 활 솜씨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종종 춘당대(春塘臺)에서 여러 신료들과 활쏘기를 하여
성적이 뛰어난 신하에겐 상을, 그렇지 않은 자에겐 벌을 내렸다. 득중정(得中亭)에서 신하들과 한 활쏘기에서 정조는
유엽전을 6순하여 30발 중 24발을 맞추는 등 신하들과는 큰 차이로 1등을 할 정도다.
사료에 따르면, 정조는 백발백중의 명궁이었지만, 일부러 신하들의 체면을 고려하여 1순(다섯 발) 중 한 발은 빗나가게 쏘았다고 한다.
정약용의 『북영벌사기(北營罰射記)』에 보면, 당시 정조가 활을 제대로 못 쏜 신하들을 북영에 잡아 놓고 하루에 20순씩 연습하도록 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약용은 정조에 의해 활쏘기를 강제로 배운 것을 매우 고맙게 여기며, 이후 활쏘기에 깊은 애정을 보인다.
정조는 활쏘기와 더불어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호흡법을 제시하였다. 호흡법은 도가(道家)에서는 양생의 방법으로,
무가(武家)에서는 공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매우 중시하는 수련이다. 정조의 수상록인 『일득록(日得錄)』을 보면, 정조가 호흡법을 아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 책에서 호흡법, 즉 조식(調息)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식은 반드시 먼저 정좌에 힘써야 한다. 정좌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즐거워진다. 즐거워지면 호흡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
들이마실 때에는 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내뱉을 때에는 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순환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조금의 흔적도 남지 않으면
사람이 진실로 병이 없게 되고 공력도 순수해진다."
이처럼 정조도 문과 무를 겸전한 군주였으며, 부군인 사도세자의 뜻을 이어받아 십팔기를 조선의 국기(國技)로서 확고한 체통을 세우고자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으며, 이 책의 서문을 직접 적어 조선 무예 십팔기의 유래와 의의를 대내외에 당당히 선포한다.
사단법인 대한십팔기협회(大韓十八技協會)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 11-9 호혁빌딩 3층 TEL : 02-3482-1871 / 010-8081-0825 / 010-7727-5477 E-mail : master@sibpalki.or.krCopyright © 2024 대한십팔기협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