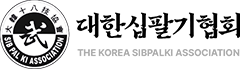무언
무언(武諺)
[文以評心 武以觀德]
글로는 마음을 평하고, 武로는 덕을 살핀다.
글이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해낸 것이며, 무란 무예를 펼치는 사람의 도덕과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내용을 통하여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으며, 무예를 사용하는 목적과 효과를 통하여
무예를 펼치는 사람의 도덕이 높고 낮음을 살펴 볼 수가 있다.
[未會學藝先識禮, 未會習武先明德]
技藝를 배우기 전에 먼저 禮를 알아야 하고, 武藝를 익히기 전에 먼저 德을 밝혀야 한다.
<禮>란 공손하고 삼가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社長을 존경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규범이다.
<德>은 武德, 즉 尙武崇德의 정신이다. 예를 아는 사람을 스승을 존경하고, 道를 중히 여기니 무예의 진체眞諦(참된 도리)를 배울 수가 있다.
덕이 밝은 사람은 도덕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으며,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일에는 용감하게 자신의 힘을 다 바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무예를 사용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긴다. 예로부터 무예를 전수하는 과정에서는 예의를 모르고 덕이 없는 자를
제자로 거두는 것을 경계하여 왔다. 먼저 무예를 가르치기 전에 禮와 德을 가르치고 그후에 技藝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嚴師出高徒, 重道得眞諦]
엄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나오고, 道를 중히 여겨야 眞諦를 얻는다.
무술의 전승 중에서는 예로부터 스승은 엄해야 하고, 제자는 道를 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스승이 엄해야 제자로 하여금 武德을 엄하게 지키고, 공손하고 삼가는 자세로 처세하여 무술을 발양시킬 수 있다.
스승이 엄해야 제자들은 엄격한 가르침과 훈련 속에서 올바른 규율을 배우고 기예를 정미하게 단련하게 된다.
重道는 무도를 숭상하고 무술을 애호하는 것이다. 도를 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무술의 眞諦를 추구하면서
힘들고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분투 노력하게 된다. 이런 사람만이 스승을 존경하면서 스승이 전수하는
지식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실천에 힘써 그 중의 眞諦를 깨닫게 된다.
[下場如書生, 上場似猛虎]
평소에는 서생과 같고, 싸움에서는 맹호와 같다.
무예를 익히는 사람은 무와 덕을 골고루 닦는 과정 속에서 무예를 정미하게 익히고 성정을 도야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평소에는 마치 서생과 같이 단아하며 세상의 정리에 통하여 예를 갖추었으나, 연무시나 대적시에는 맹호와 같이 신속하고 사나워야 한다는 것이다.
[徒弟技藝高, 莫忘師父勞]
제자의 기예가 높아도 사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순자에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푸르며, 얼음은 물이 언 것이나 물보다 차갑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비유한 천고의 명언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학술과 기예가 비로소 향상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기예가 높아지고 학문이 높아졌다 해도 자기가 스승의 은혜로 기예를 전수 받았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커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에는 스승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색이 없었다면 청색이 나올 수가 없고, 물이 없었다면 얼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手眼相隨, 手到眼到]
손과 눈이 서로 따르고, 손이 이르면 눈이 이른다.
손은 동작의 공방에 관한 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이다. 拳式 동작과정 중에서 눈은 동작의 중요한 부위이다.
예를 들면 左拳을 찌르면, 눈도 좌권의 출격을 보아야 한다. 동작의 중요한 부위가 예정된 위치에 이르게 되면, 또한 동시에 예정된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를 향해 拳을 찌를 때 눈 또한 목표를 응시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손이 이르면 눈도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敎不嚴 拳必歪, 學不專 拳必濫]
가르침이 엄하지 않으면 拳이 바르지 못하고, 배움이 전일하지 않으면 拳이 외람 된다.
이 말은 스승은 엄격하게 가르쳐 권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제자는 전심을 다하여 권이 제멋대로 외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하게 가르치려면 먼저 엄격하게 동작의 규율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은 제자들이 규율에 따라 연습하도록 엄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정확한 권식을 가르칠 수가 있다. 배우는 제자는 전심을 다해 배워야만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전일 하게 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를 익혀도 정미하게 된다.
[進步宜低, 退步要高]
발이 나아갈 때는 낮아야 하고, 뒤로 물러날 때는 높아야 한다.
대적 시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중심을 낮춰서 자신의 안정성을 강화시켜 힘을 발하는 기틀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신을 긴밀하게 호응하며 상대가 방어하면서 공격해 오는 수법을 방비해야 한다.
물러날 때는 중심을 높여야 한다. 중심이 놓으면 步法이 영활 하여 신속하게 상대에게서 피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빨리 步法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
[師父領進門, 修行在個人]
스승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지만, 수행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무술의 단련은 배움과 단련이라는 두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배운다는 것은 무술의 동작을 배우고 익혀 단련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며,
스승의 책임은 여기에 있다. 제자가 배우고 익히면 문에 들어선 것이다. 단련은 무술의 기술 동작을 숙달하여 무술의 공용을 획득하는 근본 수단이다.
오직 개인의 노력과 단련을 통해서만이 스승이 전수한 기예를 자기의 공부로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나태하지 않고 굳건한 수행과정 속에서
기법을 체험하고 拳理를 깨닫게 된다. 또한 개인의 노력과 단련을 통해서만이 강건한 신체를 갖게 되고, 性情을 도야시킬 수 있다.
攻防에 관한 技藝는 몸소 반복하여 실천하고, 실천의 변화에 응하여 자신의 打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道學容易, 修道艱難]
도를 배우기는 쉬워도 도를 닦기는 지극히 어렵다.
道를 배우기는 쉽다는 말은 스승에게서 무술의 기예와 익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심지어는 계통적으로 어느 문파의 권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道를 닦기는 어렵다는 말은 강한 인내를 갖고 열심히 고련 하는 것이다. 일의 번잡, 계절의 변화 성과의 고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拳藝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무학의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끊임없이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구하면서
道와 德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步大不靈, 步小不穩]
보폭이 크면 영활 하지 않고, 보폭이 작으면 안정되지가 않다.
보폭이 크기는 拳式의 평형과 열활 함에 관계가 있다. 보폭이 크면 지탱하는 면이 커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보폭이 크면 신체 중심을 이동하여 새롭게 평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보폭이 작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양자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연속 운동 중에서 보폭이 약간 작아야 하고, 정지 자세에서는 보폭이 조금 커야 한다.
이밖에도 步法의 高·中·低로 말하면, 높으면 영활 하나 浮하게 되고, 낮으면 안정되나 滯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중을 취하는 게 적당한고 여긴다.
[心意爲主帥, 眼耳爲先鋒, 活步如戰馬, 手脚似刀兵]
마음은 대장군이 되고, 눈과 귀는 선봉이 되며, 활보는 전마와 같고, 손발은 도병과 같다.
이 말은 무예를 익힐 때 신체 각 부위의 보조가 일치되어 각기 그 능력을 시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눈과 귀 등의 감각 기관은 행군의 선봉과 같아서 먼저 외계의 상황과 적수의 변화를 감촉하고, 心은 대장군과 같아서
느끼고 접촉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여 肢體運動을 지배하는 意로써 발출한다.
步는 의식을 따라서 활동하니 전마와 같이 신체를 태우고 나아가고 들어가거나 움직인다.
손·발은 刀·兵과 같이 의식의 지배하에 갖가지 공방의 기법의 기법을 운용하여 완성한다.
[練大使小, 練長用短]
크게 연습하여 작게 사용하고, 길게 연습하여 짧게 사용한다.
이것은 拳式 동작의 폭에 관한 크기가 연습시와 격투시는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연습시에는 자세를 벌려 크게 하고, 길게 發招하는 것이 몸을 단련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대적시에는 拳式을 벌리면 합하기 어렵고, 길면 회수하기 힘들어 자신의 요해를 엄밀하게 지키기 어렵고 또한 쉽게 결점을 노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拳式 동작의 폭은 작아야 하고, 發招 또한 짧아야 한다.
[眼無神, 拳無魂]
눈에 神이 없으면, 拳에 魂이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여 눈으로 동작의 공방 의미를 표현해내고,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도록 요구하였다.
동작의 공방 의식, 연습자의 개성은 바로 拳技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흡사 사람의 영혼과 같다.
그러므로 "눈에 神이 없으면, 拳에 魂이 없다"고 하였다.
[手打三分步打七, 勝人重在手步齊]
손으로는 삼 푼을 치고 발로는 칠 푼을 치며, 상대를 이기려면 손발을 같이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대적시에 발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손으로 멀리 상대를 치려고 하면, 발에 의지하여 멀리 나아가야 한다.
몸이 상대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면 발에 의지하여 번개처럼 피해야 한다. 또한 발에는 걸어 넘기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손으로는 삼 푼을 치고, 발로는 칠 푼을 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발로 칠 푼을 친다"는 말은 결코 상대를 쳐서 쓰러뜨린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를 쳐서 쓰러뜨리려면 손으로 치는 것과 배합해야 한다. 손과 발이 동시에 힘을 발하여 상대를 격중시키는 일정한 공방 위치에 도달해야 비로소 주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이기려면 손발이 같이해야 한다"는 말이다.
[內不動, 外不發]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밖으로 發할 수 없다.
외형의 동작은 내부 意氣의 지배를 받는다. 만일 의념이 동하지 않으며 氣가 흐르지 않으니, 外形은 저절로 발동할 수 없게 된다.
의식의 지배하에서 뜻으로 氣를 움직이니, 뜻이 이르면 기가 이르게 되고, 기가 이르면 힘이 발하게 되어 외형을 끌어 움직이지, 비로소 法을 얻게 된다.
[逢閃必進, 逢進必閃. 閃卽進, 進卽閃]
피하면 공격하고, 공격해 오면 피해야 한다.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이다. 閃은 피하는 동작으로 방어 방법이다. 進은 나아가는 것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을 가리킨다.
격투 중에 만일 피하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비록 아주 잘 피한다. 해도 자신만 보존할 뿐 승리를 거둘 기회가 없다.
또 공격만 알고 피할 줄 모른다면, 일단 공격이 실패했을 때 상대가 그 기세를 타 공격해 오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
이 양 폐단을 피하려면 공격해 들어가고 재빨리 피하는 두 가지가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권으로 내 흉부를 쳐오면,
나는 몸을 낮춰 상대의 측방으로 피함과 동시에 아랫배를 공격해 들어간다. 이 타법에서 몸을 낮추었으므로 몸을 옮기는 것이 "閃"이고,
상대의 拳을 피하고 다시 나아가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進"이다.
[外練筋骨皮, 內練一口氣]
밖으로는 筋肉과 뼈와 피부를 단련하고, 안으로는 한 호흡의 氣를 단련한다.
氣는 呼吸의 氣와 意識이 지배하여 체내를 운행하는 내기를 말한다. 무예를 익히는 사람은 "外練"을 하면,
또 "內練"을 하여 "외형"과 "내기"가 조화되어야 한다. 內外를 서로 겸하여 연공해야 내장과 외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법 연습에서는 몸으로 기를 이끌고, 기로써 몸을 움직이게 하여 "근육·뼈·피부"와 "內氣"가 동시에 단련되도록 한다.
[一動無有不動, 一停無有不停]
하나가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가 정지하면 머추지 않는 것이 없다.
무예는 신체 각 부위의 전체적인 운동에 중점을 둔다. 위가 움직이면 아래에서 따르고, 아래가 움직이면 위에서 이끌어 준다.
그리고 안에서 움직이면 밖의 움직임을 이끌고, 밖이 움직이든 움직임으로 면 안의 움직임을 이끈다.
이렇게 동일한 의념의 지배하에서 신체의 어느 한 부위가 움직이면, 신체의 다른 부위도 협동하여 움직인다.
신체의 어느 한 부위가 목표물에 도달하면, 신체의 각 부위 또한 예정된 목표에 도달하여 일제히 움직이고, 나아가고, 이르고, 정지하는 모표현되어 나온다.
[拳練百遍, 身法自現, 拳練千遍, 其理自見]
권법을 백 번 익히면 신법이 저절로 드러나고, 권법을 천 번 익히면 그 이치가 스스로 나타난다.
권으로 치고 발로 차는 법은 비교적 익히기 쉬우나, 가슴과 허리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身法은 익히기가 어려운 기법이다.
그러므로 권술을 수없이 반복 연습하여 권법이 원숙해져야 비로소 상하 동작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勁力이 도달하게 되며,
허리 관절이 움직이면 사지가 따르게 되고, 根과 梢가 움직이면 허리 관절이 따르는 등 신법의 특점이 충분히 표현된다.
이렇게 되면 身法의 영활함 또한 자연스럽게 拳式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바로 신법은 자연스러움을 귀히 여긴다는 이치이다.
또 수백 수천 번 권술을 연습해야 비로소 拳理를 깨우치게 된다. 가령 스승이나 혹은 책을 통하여 拳理의 技法을 이해했다 해도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비로소 동작의 기증을 깨우칠 수 있다. 그 도리는 "실천에서 진정한 깨우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學會三天, 練好三年]
삼 일 동안 배운 것은 삼 년 동안 익혀야 한다.
삼 일이란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삼 년은 기나긴 시간을 말한다. 즉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招法이나,
하나의 拳路라 해도 그것을 잘 단련하려면 장기간 갈고 닦아야 숙련되게 되며 숙련되어야 깨닫게 된다.
[冬練三九, 夏練三伏]
겨울에는 三九에 단련하고, 여름에는 三伏에 단련한다.
무예의 단련은 쉬지 않고 연마해야 한다. "삼구"의 엄동과 "삼복"의 한여름이라도 쉬지 말고 계속 무예를 익혀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혹한과 혹서를 이용하여 신체를 단련하면 많은 단련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우선 사람이 가장 움직이기 싫어하는 한서에 쉬지 않고 연습하면,
사람의 의지력과 인내심을 배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신체가 추위와 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자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므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과 기술 연습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므로 힘과 인내력 등을 연습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百看不如一練, 百練不如一專]
백 번 보는 것은 한 번 익히는 것만 못하고, 백 가지 익히는 것이 하나의 정통함만 못하다.
이 말은 무예 단련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예는 친히 실천하고 단련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백 가지 익히는 것이 하나의 정통함만 못하다"는 말은 무술을 익히면서 아침에는 이것을 저녁에는 저것을 익히면서
닥치는 대로 많이만 배우려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정심하게 익힐 수 없으며,
심지어는 拳技의 細節도 알지 못하고, 拳理도 분명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응당 진지하게 배우고 점차 깊이 들어가
계통적으로 익힌 후에야 다시 다른 것을 연마해야 비로소 정심하게 익힐 수 있다.
[不파千招會, 就파一招熟]
천 초를 펼 수 있다고 하여 두려워 말고, 한 초가 숙련되었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技藝의 숙달을 강조하고 있다. 초식이 숙련되어야 대적시에는 마음대로 응수할 수 있으며, 공방이 적절하게 된다.
숙련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있다. 널리 천 초를 배운 기초 위에 몇 초를 정련하여 지극한 "숙련"을 위주로 해야 한다.
만약 많은 초법을 익힐 수 없었다면,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적으면서도 정련한다는 원칙으로 단지 몇 초, 심지어는 한 초라도 절정에 이르도록 익혀야 한다.
技藝의 묘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숙련됨에 있다.
[無人似有人, 有人若無人]
상대가 없을 적에는 상대가 있는 것과 같이 연습하고, 상대가 있을 적에는 상대가 없는 것처럼 대적한다.
이것은 심리 훈련의 요결이다. 개인이 혼자 拳路를 익힐 때는 一招一式 모두 적수와 겨루는 것처럼 연습해야 한다.
이렇게 연습해야 권법을 익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拳式의 攻防 의미를 익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 연습하다 보면 일단 적과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고 혼자 익혔던 대로 적과 대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적할 때는 무인지경에 들어선것처럼 과감하게 적을 노려보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攻防의 주도권을 잡아 공격해야 한다.
[練從難處練, 用從易處用]
단련은 어려운 것을 단련하되 사용할 때는 쉬운 것을 사용하라.
훈련중에는 완성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동작을 익혀야 하나, 실제 운용시에는 자기가 능숙하게 펼칠 수 있으며 쉽게 틀리지 않는 동작이나 招法을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것을 익히므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견실한 기초가 되게 한다.
사단법인 대한십팔기협회(大韓十八技協會)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 11-9 호혁빌딩 3층 TEL : 02-3482-1871 / 010-8081-0825 / 010-7727-5477 E-mail : master@sibpalki.or.krCopyright © 2024 대한십팔기협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