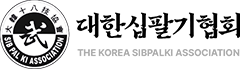권법요결 - 삼절법
삼절법(三節法)
무예이론으로는 사람의 몸을 삼절三節로 나눈다. 즉 손과 팔은 초절梢節이 되며, 허리와 배는 중절中節, 발과 다리는 근절根節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면, 삼절三節의 각 부분을 또다시 삼절三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손手은 초절梢節의 초절梢節이 되며,
팔꿈치는 초절梢節의 중절中節이 되고, 어깨는 초절梢節의 근절根節이 된다. 또, 가슴은 중절中節의 초절梢節이 되고, 배服는 중절中節의 중절中節이 되며,
단전丹田은 중절中節의 근절根節이 된다. 발은 근절根節의 초절梢節이 되고, 무릎은 근절根節의 중절中節이 되며, 대퇴大腿는 근절根節의 근절根節이 된다.
삼절三節의 요결要訣은 <초절은 일어나고, 중절은 따르고, 근절은 이를 쫒는다. 梢節起, 中節隨수행하다, 따라가다, 根節追>는 것이다.
즉 <기起 ㆍ수隨 ㆍ추追>의 삼자三字로 요약된다. 예를 들면 주먹拳 을 치는 동작에서 권拳은 초절梢節의 초절梢節이 되고, 권拳이 움직인 후에
팔꿈치中節가 따르고, 어깨根節가 이를 쫒게 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힘을 발휘하여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다. 앞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
발이 일어나면起 무릎이 따르고隨 대퇴大腿가 이를 쫒는다追. 이렇게 해야 비로소 중심을 잡고 앞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발가락이 땅을 잡아 온건하기가 태산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손과 팔이 일어나 앞으로 치고 나아가면 허리와 가슴이 따르고 발과 다리가 이를 쫒는 것이다.
초절梢節이 일어나 이끌고 나아가면, 중절中節은 초절梢節이 향하는 곳으로 순리대로 따르면서 힘을 더해주고, 근절根節은 이를 쫒되
온건하면서도 안정되게 신체를 지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탱하는 반작용의 힘을 중절中節을 통해 초절梢節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좌궁보左弓步를 만들면서 오른손으로 앞을 향해 찔러 칠 때, 초절梢節인 우권右拳이 공격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중절中節인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 앞으로 나아가고 팔꿈치는 앞으로 뻗어야 한다.
근절根節인 하지下肢는, 양발바닥은 착실하게 땅을 딛고 발가락은 땅을 움켜쥐듯 고정되어야 한다. 왼쪽 다리는, 지탱하는 반탄력反彈力을 위로 전傳해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받쳐 주어야 한다. 동시에 오른쪽 다리는 굳건하게 지탱하여 반탄력의 힘을 순차적으로 오른쪽 무릎과 허리를 거쳐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를 통하여 오른손 권면拳面에 순조롭게 바로 전해주어야 한다.
삼절三節은 무예武藝 동작과정 중 지체肢體 배합운동의 기본원리가 된다. 즉, 상지上肢는 인체의 내기內氣가 어깨를 통하고, 팔꿈치를 경유하여
손목을 지나 손에 이르는 길이 된다. 하지下肢는 인체의 뿌리가 되므로 온건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몸통구간軀幹은 인체에서 중절中節이 된다.
이를 다시 척추에서 상절上節 ㆍ중절中節 ㆍ하절下節로 나누며, 요추腰椎는 중절中節의 중절中節이 되고, 요추腰椎의 위는 중절中節의 상절上節이 되며,
요추腰椎의 아래는 중절中節의 하절下節이 된다. 중절中節의 하절下節은 가슴과 허리를 받쳐서 세워주며, 돌고 움직이는 데 기초가 되어야 기氣가 단전丹田으로
돌아오는데 유리 할 뿐만 아니라, 기氣가 사초四梢로 통하는 데도 유리하므로 반드시 온건해야 한다.
하나의 기氣로 연결되어 원활히 움직이게 해야 한다. 중절中節의 상절上節은 앞뒤로 기울거나 좌우左右로 돌 때 허리를 따라 움직여야 신법身法 동작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상절上節은 허리를 따라 순리대로 움직여야 한다. 근절根節은 발發하는 경력勁力을 이끌어 초절梢節에 옮겨주고, 초절梢節은 공격해 나아가는 동작의 방향을
목표로 인도하여 서로 결합하므로 근根과 초梢는 서로 이끄는 것이 된다. 즉 초절梢節은 인체의 끝부분으로 공격하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근절根節은 공격하는
초절梢節을 지탱해 주는 신체부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팔꿈치로 찔러 칠 때에는 팔꿈치가 초梢가 되고, 신체를 지탱하는 양다리는 근根이 된다. 팔꿈치는 상지上肢에서 중절中節이 되지만, 공격해 나아가는 부위의
끝 부분이 초절梢節이 되므로, 팔꿈치로 공격할 때에는 팔꿈치가 초절이 되는 것이다. 중절中節은 초절梢節과 근절根節 사이를 말하며 움직임의 규격, 공격의 정확성,
경력勁力의 축蓄과 발發 등에 영향을 준다. 중절을 다시 설명하면, 전신全身에서 볼 때 몸통이 중절이 되고, 몸통의 중절은 허리가 된다. 외형의 동작은 허리를 축으로 삼고
사지를 움직이니, 상하가 서로 따르고 좌우가 서로 돌보게 된다. 그러므로 허리의 영활성은 기예技藝의 수준을 가늠하는 표준의 하나이다. 만일 권법拳法을 연마하면서
허리가 유연하고 영활하지 못하면 그 기예技藝도 높아질 수가 없다.
상지上肢에서는 팔꿈치가 중절中節이 되며, 중절中節은 초절梢節을 따라야 한다. 만약 팔꿈치가 순리대로 초절梢節의 움직임이나 굴신屈伸을 따르지 못하면,
상지上肢의 운동 노선이 흐트러져 동작이 원하는 규격에 맞지 않고, 경력勁力의 방향도 확실치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주먹을 찔러 칠 때 주먹은 앞을 향해 곧게 뻗고,
팔꿈치는 이에 응하여 주먹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만약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 권拳의 방향은 안으로 치우치게 되고, 팔꿈치가 안으로 움직이면 권拳의 방향은
밖으로 벌어지게 된다. 팔꿈치가 아래로 움직이면 권拳의 방향을 위로 옮겨지고, 팔꿈치를 위로 들면 권拳의 방향은 아래를 향하게 된다.
하지下肢에서는 무릎이 중절中節이 된다. 앞차기 등 곧게 헤치면서 차는 퇴법腿法이 완성됐을 때의 요구사항은 상지上肢의 경우와 같다.
즉 무릎은 발이 공격하는 자취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앞차기 ㆍ등퇴 등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차는 퇴법腿法의 과정에서는, 무릎과 발이 따라 일어나면서
긴밀히 연결되어 무릎이 안정된 후에 발로 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먼저 무릎을 구부려 들어 올려 무릎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대퇴부를 통해 나온 경력勁力이
무릎을 통해 발로 전해져 공격 목표를 향해 차가는 것이다. 주의 할 점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팔꿈치와 무릎을 밖으로 벌리면 안 된다.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면
겨드랑이가 드러나게 되어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되고, 또 앞을 향해 칠 때 직선으로 목표에 이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팔꿈치는 옆구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며, 손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구부려 거두어들일 때에도 팔꿈치가 반드시 옆구리 부분에서 나아가고 들어와야 한다. 또한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면,
가랑이가 드러나게 되어 가랑이 부분을 방어하기 어려워 해를 입게 되고, 무릎 안쪽을 공격당하기 쉽게 된다.
옛글에 『삼절三節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손 ㆍ발 ㆍ몸이 정밀하게 배합된다』라고 하였다. 초절梢節을 안다는 것은 양손은 서로 변환하고, 몸과 마음이 서로 따르면서,
서로 구원하고 보호 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중절中節을 안다는 것은 손은 가슴과 배를 떠나지 않고, 팔꿈치는 늑골을 떠나지 않으며, 높이 뛰어오르거나, 낮게 내리누르거나,
좌우左右를 막고 감싼다는 뜻을 말한다. 또한 근절根節을 안다는 것은 낮게 나아갔다가, 높게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발이 나아가는 데 몸이 따라 나아가지 않거나 발이 물러나는 데 몸이 따라 물러나지 못한다면, 수법手法이 제아무리 익숙하다 해도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이 이르면 몸이 이르고, 보步가 변화하면 즉시 몸이 돌아 상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공격할 때에는 용감하게
주먹이 나아가면서 몸이 따르고, 발이 이를 쫒으면서 전신의 힘을 권拳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쳐야 한다.
권법拳法의 모든 동작은 삼절三節을 배합한 움직임으로, 진進 ㆍ퇴退 ㆍ격타擊打 시에 신법身法을 함께 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身 ㆍ손手 ㆍ발脚 ㆍ내외內外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연습의 요결이 된다.
사단법인 대한십팔기협회(大韓十八技協會)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 11-9 호혁빌딩 3층 TEL : 02-3482-1871 / 010-8081-0825 / 010-7727-5477 E-mail : master@sibpalki.or.krCopyright © 2024 대한십팔기협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
TOP